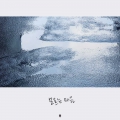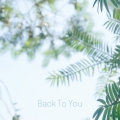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일
감정을 반드시 표정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 숱한 감정의 몸살을 앓으며 밤을 지새워 온 사람은 저마다 고유의 개성과 일정한 주파수를 지니게 되니까. 피아니스트, 작곡가, 영화음악가 등 여러 얼굴을 가진 ‘음악인 임자연’의 얼굴을 더듬어 보다가, 그녀의 음악이 짓고 있는 표정을 이렇게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지 못한 일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임자연은 늘 조금은 기쁜 듯, 어쩌면 슬픈 듯이 헤아릴 수 없는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 그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감정의 착각을 일으킨다. 분명히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금방 식어 버린 커피의 진한 씁쓸함이 코끝을 맴도는 기분이 들고, 슬퍼지려는 순간에 그토록 예쁘고 아름다웠던 우리가 떠오르며 애틋해지는 것이다.
익숙한 당신에게 달려가는 설렘처럼, 봄의 걸음걸이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넘실대는 마음을 애써 꾹꾹 눌러 담던 사소한 밤의 시간처럼, 그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순간들이 음악으로 구체화되고, 우리 곁에 살며시 녹아든 음악은 추억이 된 기억을 되살려 각자의 표정을 짓게 한다.
이것이 임자연의 음악이다. 감정이 마음을 만나서 그려내는 찰나의 이미지를 집요하게 포착해 피아노의 언어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이는 음악을 구성하게 된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들며 다른 이야기를 짓게 하는 기초와 영감이 되고, 우리는 서로를 전하며 보다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음악인을 특정 장르에 가두어 수식으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그래왔듯,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일을 반복할 때, 음악인 임자연의 얼굴이 가장 선명해진다. 지금 그녀가 ‘자연스럽게’ 짓고 있는 표정이 바로 그러하므로.